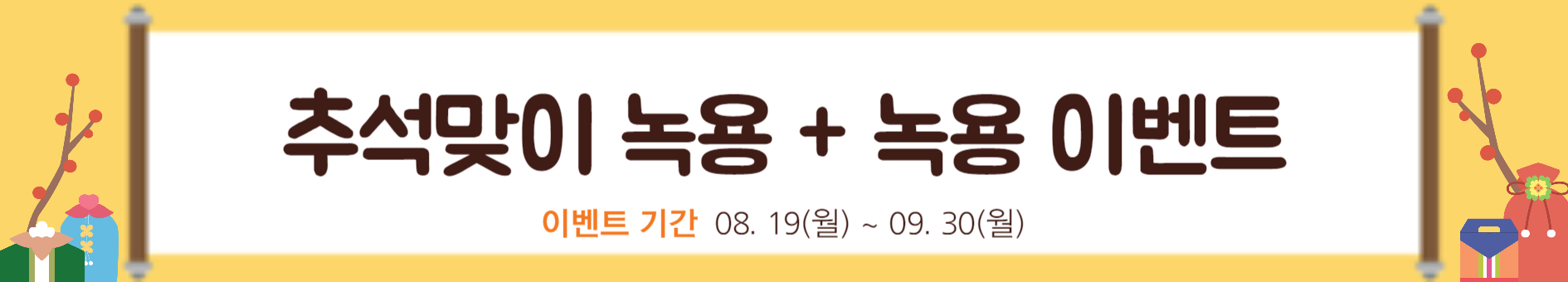[김판규의 한방 이야기] 동서 몰래 내민 보약…한가위 情 물씬 (16년 09월 12일)
 명제한의원
명제한의원  2018-10-23
2018-10-23
그해 가을은 유난히 더웠다. 엿가락처럼 늘어진 여름 탓에 자귀나무꽃이 졌다가 다시 피는 기현상이 연출되는 시골집에는 경희라는 이름의 맏며느리가 살고 있었다. 두 평짜리 화단에는 애기별꽃, 꽃마리, 풍노초 등의 풀꽃이 있고 조경수라곤 자귀나무가 유일하다. 경희의 혼수에 이 자귀나무가 든 것은 합환목이라는 이명(異名)처럼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와 바람 때문이었다. 연애시절 지붕에 구멍이 난 남루한 집이라도 함께 누워 별을 헤며 잠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남편의 소박함에 감동했다. 가난한 집 딸이라 당연히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여겼고,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어릴 적부터 새긴 뜻이었고, 둘이 열심히 하나하나 살림을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.
기제사만 일곱에 차례까지 매년 아홉 번의 제사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집안의 맏며느리 경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 설거지까지 한 후 출근했다. 퇴근 후 다시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 다음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다. 연료비를 아끼라는 시어미의 엄명에 따라 한겨울에도 더운 물 한 방울 쓸 수 없었다. 부도 맞은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돼도 경희를 보증인으로 세워 계속 사업을 한다며 처음 약속과 달리 한탕주의 본색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. 바람피다 이혼당한 시누이는 친정으로 들어와 화장을 하거나 의상코디를 하는 것 외에는 온종일 손끝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.
차례음식을 장만하는 경희의 숏커트 머리카락 끝에 맺힌 땀방울은 시든 별빛처럼 애처로웠다. 탕국을 끓이랴 전을 부치랴 부엌은 마치 복날 삼계탕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. 1년 전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은 경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. 자신을 위한 한약복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간(肝)에 열이 쌓이면서 갑상선기능장애가 생긴 것이다. 소시호탕을 장복하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한의사의 조언은 눈물만 부추기는 송곳이 되었다. 일찍 청상이 된 시어미는 홧병으로 홍삼을 먹을 수 없음을 알고 선물 받은 홍삼을 경희에게 줬지만 홍삼을 먹을수록 더 열이 오르고 몸이 무거워졌던 이유가 갑상선장애 때문이었음을 몰랐던 것이다. 초인종소리가 울린다. 시동생네 식구들이다. "형님,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 우리 거의 외식하는 거 아시죠." 선물꾸러미를 내려놓자마자 한 아랫동서의 첫인사였다.
이웃집 마실을 갔던 시어미가 한약을 한 재 지어 들고 들어온다. "그거 제가 달일께요"라는 경희를 흘겨보던 시어미는 "지난번 한약도 태워먹더니 또 그러려고"라며 약탕기를 꺼내 깨끗이 씻고는 물을 부어 한약을 앉힌다.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약냄새가 온 집안을 풍요로운 향기로 가득 채웠다.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쁜 날 보약을 지어온 시어머니가 밉고 또 서러웠다. 손수 정성스럽게 한약을 짜서 안방으로 들어간 시어미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방문을 빼꼼이 열고는 경희더러 들어오라고 손짓한다. 경희에게 약사발을 내미는 시어머니. "이거 너 주려고 지어온 약이다. 작은 아이 오기 전에 어서 마시렴." 엉겁결에 약사발을 받아든 경희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.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합환목 이파리가 가만히 경희네 방 창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.
명제한의원 원장
출처 : 국제신문 - 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700&key=20160913.22027192458